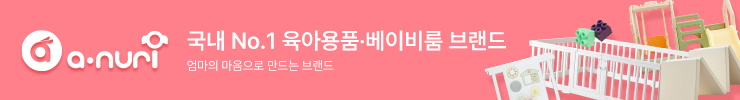|
| ▲류인채(시인, 문학박사) |
[맘스커리어 = 류인채 시인] 여섯 살 때이다. 한겨울에 태어나서 양력으로 따지면 다섯 살이던 나는 새벽녘 잠에서 깨어 소스라치게 놀랐다. 제삿날이라 큰집에 함께 갔던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나만 혼자 낯선 방에서 자고 있었다. 순간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서글펐다. 평소에 부모님은 나보다 언니와 남동생을 편애한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은 결혼한 지 칠 년 만에 언니를 낳고 둘째인 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청상인 할머니는 내가 남동생을 보라고 돌림자인 ‘寅’ 자 밑에 ‘얻다’라는 의미의 ‘採’ 자를 넣어 ‘寅採’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가난했지만 장곡사에 쌀 두 말을 시주하고 스님에게 내 이름을 받아오셨다고 한다. 그 후 신통하게도 남동생이 태어났다. 세 살 무렵부터 신문 제목을 줄줄 읽어 신동으로 소문난 언니에 비해 설은 나는 내 이름조차 쓰지 못했다. 잔병치레가 잦은 동생은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무조건 사랑을 받았다. 그런 속에서 나는 말수가 적은 아이로 자랐다. 마음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을 했지만, 입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눌했다.
그날 나는 가족과 분리된 불안감 때문에 무작정 집에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달밤에 어린 여자아이가 걷기에는 만만치 않은 길을 혼자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슬그머니 큰집 방문을 열고 검둥이가 짖지 않도록 깨금발로 걸어 앞마당에 나와 보니 달빛이 훤했다. 나는 단숨에 무랑골을 지나 도치정골을 지나 느락골에 다다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굽이굽이 논길을 몇 개 지나고 언덕을 지나고 산모퉁이를 돌아 오르막길로 한참 올라가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큰집 텃밭을 끼고 논둑길에 들어서자마자 시퍼렇게 자란 벼 잎이 송곳처럼 종아리를 찔렀다. 여러 번 뱀을 만난 좁은 논둑길을 지나 도치정골 앞 언덕에 다다르자 갑자기 다리의 힘이 풀렸다. 밭둑에 일 열 횡대로 선 미루나무들이 검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흉물스러웠다. 순간 나는 발을 헛디뎠다. 내 키의 서너 배는 될 듯한 높은 언덕 아래 도랑으로 데굴데굴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온몸이 아팠다.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나 큰길로 나왔다. 낮에 소꿉놀이하며 놀던 산이 시커멓게 우거져 있고 그 속에서 사나운 짐승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 것만 같았다. 어디서 호랑지빠귀(귀신새) 울음소리도 들렸다. 보름을 지나 조금 이지러진 달이 구름 속에 숨어들었다. 나도 어딘가에 몸을 감추고 싶었다.
어슴푸레 느락골 산모퉁이가 보였다. 아이들은 밤마다 거기서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흐느낀다고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걷는데 갑자기 사그락사그락 소리가 들렸다. 온몸에 솜털이 오소소 일고 머리끝이 치솟는 느낌이었다. 자꾸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소리는 내가 멈춰 서면 사라지고 걸으면 다시 들려오곤 했다. 나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었다. 하지만 모두가 잠든 시각, 오히려 내 울음이 잠자던 귀신을 깨울 것 같아 최대한 발소리를 줄여가며 살금살금 걸었다.
산모퉁이에서 우리 집까지 어떻게 올라왔던지,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나는 어떤 힘에 떠밀리듯 재빨리 마루로 뛰어올라 안방 문고리를 잡아채며 바닥에 엎어졌다.
곤히 자던 식구들이 깜짝 놀라 후다닥 일어났다. 동생이 자지러지게 울고, 어머니는 지푸라기투성이로 젖은 내 옷을 갈아입히며 “이게 웬일이니? 웬일이야!”를 연거푸 되뇌시고, 아버지는 서둘러 무랑골로 가셨다. 전화로 소식을 전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큰집에서는 안방에서 곤히 자던 어린애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뒷간을 뒤지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고…… 발칵 뒤집혔더란다.
제사는 끝났다. 내가 잠든 사이 식구들이 사라졌다. 무랑골 큰집 낯선 방에 나만 두고 갔 다. 어서 집에 가야 한다. 칠 년 만에 낳았다는 언니, 남동생만 데리고 갔다. 여섯 살 나는 버리고 갔다. 집에 가야 한다. 보름을 넘긴 이지러진 달빛을이고 굽이굽이 논둑길을 지나 산과 맞닿은 신작로 끝 밤마다 누가 흐느낀다는 산모퉁이를 지나 집에 가야 한다. 시퍼런 벼 잎에 종아리를 찔려도 뱀이 나와 좁을 길을 막아도 이슬에 흠뻑 젖은 언덕에서 구르다 나무 꼬챙이에 얼굴을 긁혀도 도랑에 빠져도 집에 가야 한다. 당숙 네로 가는 볼모루 쪽 벌판을 보며 낮에 누워 놀던 무덤가 상석을 지나 허름한 상엿집을 지나 집에 가야 한다. 소름이 오소소 일고 으슬으슬 추울 때까지 질금질금 오줌을 지리며 딸꾹질을 할 때까지 집에 가야 한다.
집은 멀고 귀신새 울음이 발목을 잡는 밤, 나는 홀로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지금도 여섯 살 아이 혼자 밤길을 걸을 때가 있다. 동트기 전 서둘러 집에 가야 한다.
그날부터 나는 담대해졌다. 달밤에 오줌을 싸며 혼자 집에 간 ‘간 큰 애’라고 놀림받을 때마다 이슬에 흠뻑 젖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 원체험은 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둘째로 태어난 설움, 딸로 태어난 설움을 극복하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 한다는 각오와 함께 자립심이 강하고 문제해결력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 고난을 인내하며 도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 하나로 버티며 살 수 있었다. 이러한 인생관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더욱 확고해졌다.
그해 가을 어느 청명한 날, 나는 유 씨 문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어두운 밤 혼자 걷던 그 길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놀다가 교회 유치부 선생님의 손에 이끌려 예배당에 갔다. 오직 집에 가야 한다고 다짐하던 여섯 살 아이는 훗날 가정의 선교사가 되었고, 지금은 ‘아버지 집에 가야 한다’고 되뇌며 하늘을 우러른다.
맘스커리어 / 류인채 시인 2080moon@hanmail.net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