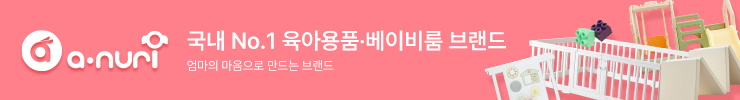|
| ▲김은희 원스팜 대표이사 / 전통요리연구가 |
[맘스커리어 = 김은희 원스팜 대표이사 / 전통요리연구가] 안녕하세요? 전통음식을 너무나 사랑해서 전통음식을 널리 알리고 있는 김은희입니다.
12월에는 작은설이라고도 불리는 동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동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월의 공기는 유난히 묵직합니다. 해는 짧아지고, 저녁은 서둘러 찾아오지요. 그런데 이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순간을 우리 조상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하나의 이름을 붙여 두었습니다. 바로 스물네 절기 중 스물두 번째, 겨울 한가운데에 자리한 절기, '동지(冬至)'입니다. 달력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적힌 글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동지는 사실 한 해의 끝과 시작이 겹치는, 아주 의미심장한 경계선입니다.
동지는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동시에 “이제부터 다시 낮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도 됩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곧 빛이 되돌아오는 최초의 지점이라는 것, 이 역설적인 진실이 바로 동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1월 1일을 새해의 시작이라고 여기지만, 옛사람들에게 동지는 이미 시간이 방향을 틀어 다시 ‘빛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날, 일종의 보이지 않는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면 해가 돌아선다”는 말에는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삶의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동지를 ‘작은 설’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농사일이 모두 끝나고, 들판도, 손도, 마음도 잠시 멈추는 시기. 곡식은 곳간에 들어가 있고, 땅 위에는 별다른 일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고요함 속에서 다음 해를 준비하는 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겨울의 정적이 있어야만 다시 봄의 싹이 돋듯, 동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자라는 절기입니다.
동지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단연 팥죽입니다. 팥을 삶아 껍질을 걸러내고, 다시 고와 죽을 만들고, 그 안에 동글동글 새알심을 넣어 끓이는 일은 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로움이 바로 동지 음식의 상징성을 드러냅니다. 붉은팥은 액운을 막고 잡귀를 쫓는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속에 넣은 하얀 새알심은 다가올 새해의 복과 수명을 기원하는 작은 씨앗 같은 존재였습니다. 한 그릇의 팥죽 속에 지나온 한 해의 고단함과 새해의 소망을 함께 담아낸 셈입니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집 안 구석구석, 문지방이나 마루 한편에 떠두기도 했습니다. 의식의 형식만 놓고 보면 다소 미신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어쩌면 “이 집은 올해도 무사히 잘 버텼습니다”라는 조용한 보고이자, “내년에도 부디 잘 지켜주십시오”라는 소박한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불빛이 귀하고 어둠이 더 위협적이던 시절, 사람들은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매개로 불안과 두려움을 달래고, 서로의 안녕을 확인하며 긴 겨울밤을 건너갔습니다.
동지의 의미는 단지 전통 풍습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동지는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의 삶에나 가장 긴 밤이 있습니다. 병으로, 관계로, 일과 사업으로, 말 못 할 걱정과 슬픔으로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있지요. 그 한복판에 있을 때는 영원히 새벽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자연은 분명히 말해 줍니다. “밤이 가장 길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미 다시 새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동지는 바로 그 사실을 몸으로 가르쳐 주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시작과 끝의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계절은 달력 속 작은 글자로만 존재하고, 하루는 스마트폰 알람에 쫓기다가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절기는 자연이 들려주는, 아주 섬세한 호흡의 언어입니다. 동지는 그 절기들 가운데서도 “멈춤과 전환”이라는 메시지를 가장 또렷하게 전합니다. “여기까지 잘 왔는지 한 번 돌아보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다시 정해 보라”는 초대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동지는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설계하는 데에 좋은 지점입니다. 잘한 것만이 아니라, 놓친 것과 후회되는 일을 함께 떠올려 보는 시간.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 외부의 평가 대신 내 마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삶의 방향을 조정해 보는 시간. 이런 조용한 성찰이 있을 때,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삶의 리듬을 다시 맞추는 ‘기준점’이 됩니다.
동지를 맞이하는 방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정성껏 끓여 가족이나 이웃과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아 “올해 참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하고 서로의 시간을 확인해 주는 것.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걸 해 보고 싶다”, “이건 이제 그만 놓아도 되겠다” 하고 마음속 다짐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는 것. 그 소박한 나눔 속에서 동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절기가 됩니다.
가장 긴 밤은, 동시에 가장 이른 새벽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동지는 어둠을 부정하는 날이 아니라, 어둠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팥죽의 온기가 피어오르고, 짧은 해 아래에서도 내년의 햇살을 떠올려 보게 되는 날. 스물네 절기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이름 같지만, 동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긴 밤도, 결국 지나간다. 그러니 두려워만 하지 말고, 다음 빛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올해 동지에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해가 어디쯤 떠 있는지, 내 마음의 해는 어디쯤 와 있는지 한 번 바라보면 어떨까요. 한 그릇의 팥죽, 한 번의 숨 고르기, 한 마디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가장 긴 겨울밤을 건너는 지혜를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맘스커리어 / 김은희 원스팜 대표이사 / 전통요리연구가 ehk0408@nate.com
※본지 칼럼글은 기고자의 의견으로 본사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