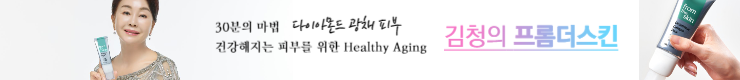청소년 임산부에게 출산휴가 줘야 할까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 중 0.4명이 출산을 경험했다. 15~19세 청소년이 출산한 아기는 2019년 1096명, 2020년 907명, 2021년 492명으로 나타났다. 15세 미만 청소년이 출산한 아기도 2020년 11명, 2021년 8명으로 집계됐다. 다행스럽게도 10대 임신은 감소하는 추세다.
여성이 임신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축복이나 학생 신분인 10대에 임신을 하게 되면 청소년 부모로서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우선 10대인 여성이 임신하는 것은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위험할 수 있다.
미국 메릴랜드 의대 캐서린 굿맨 박사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특히 10대 초반인 소녀는 10대 후반이나 그 이후에 임신했을 때보다 합병증이 생기거나 중환자실에 갈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굿맨 박사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0~19세 임산부들의 분만 기록 9만 건 이상을 조사해 10~13세 산모가 14~17세 산모보다 조산할 위험이 56% 더 높고 제왕 절개할 비율이 32%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조산율은 △10~13세는 18.5% △14~17세는 11.6% △18~19세는 10.5%로, 제왕절개로 분만한 비율은 △10~13세는 22% △14~17세는 16.4% △18~19세는 20.1%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을 한 학생이 원래 다니던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는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청소년 미혼모·임신부 학생으로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산부의 몸으로 주변의 달갑지 않은 시선을 견디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9년 12월 인권위는 출산한 학생에게 요양 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학습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 임신기간·출산 지원 서비스, 산후조리의 강화와 양육지원의 보장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76%가 학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위해 학업지원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유명무실하다. EBS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학생 미혼모 교육기관 16곳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교육청은 최근 3년 동안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연간 최대 154만 원의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있지만 학습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지난해 9월 기준 13명뿐이다.
10대 임산부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정상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고 이로 인한 빈곤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된다.
아름다운재단과 미혼모지원네트워크가 발간한 '2019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부모의 61%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으며 53%는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였다. 주거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 44.4% △가족 및 친척 거주지 15.2% △모텔이나 찜질방 6.3% 순으로 나타났으며 14.6%는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부모가 아이를 키우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영국 등에서는 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을 질병으로 인한 학업 중단 상황으로 보고 출석으로 인정해 준다. 대만에서는 임신한 학생이 출산휴가 56일과 육아휴가 2년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남학생도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태국 정부는 임신한 학생들에게 출산 휴가를 허용하고 학교에서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것을 금지시켰다.
학생에게 허용되는 출산휴가에 대해 네티즌들은 "사회규범을 떠나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조치이긴 하다" "아기를 한 명이라도 더 낳아야 하는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쏟아냈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