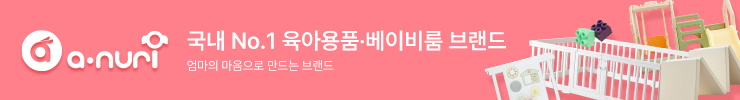▲[사진=픽사베이]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다른 서구 문화권과 유사하게 호주도 정이나 관습보다는 약속이나 계약에 기반하여 이해 관계를 다룬다. 임산부에 대한 직장에서의 태도도 이러한 사회의 기본적인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많은 직장들은 휴가나 병가, 처우 등에 대해 문서나 그에 준하는 계약을 고용인과 맺게 되고 이 조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제약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산부가 건강검진을 위해 병가를 쓰고 싶다면 회사에 미리 통보만 하면 자기에게 남아 있는 병가 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회사는 모든 직원들의 휴가나 연차에 위한 대체 인력 확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이에 대한 사유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근무 환경이 임산부에게 유해할 경우에는 회사와 의논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이 역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감정적인 마찰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논리로 보면 임산부에 대한 비합리적인 수준의 배려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공과 사가 분명한 사회 문화 특성 상 회식이나 사내 모임 또한 한국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으며, 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받는 심리적 압박도 낮다.
대도시의 생활은 호주나 한국이나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민자가 많은 다문화 사회인 호주는 공공 장소에서의 시민의식은 편차가 매우 크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임산부에게 대체적으로 호의적으로 배려하지만, 극단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임산부들도 알지 못하는 타인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준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기다려 준다든지 하는 배려를 기대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호의에 경계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도 배려를 베푸는 것에 신중해지게 된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사회 구성원 간의 암묵적인 공감대가 커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국의 시골과 유사한 정이나 배려가 더 많이 나타난다. 임산부가 힘들어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다가가서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도와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출산이 임박하면 임산부의 지인들이 모여 ‘베이비 샤워’라는 파티를 열어 아이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면서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것들을 선물한다. 호주는 태아의 성별을 알기 원하면 임신 20주차 때부터 알 수 있어 이 때 미리 아이의 성별에 맞는 옷이나 물품을 준비할 수 있다. 그와 함께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도 교환하면서 출산을 앞두고 불안해지기 쉬운 임산부의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파티는 보통 여성들끼리 갖게 되어 서로 간의 유대도 더 강해지고 출산 후 넓은 의미의 공동 육아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임산부를 위한 상품들도 한국에 비해서는 많지 않으나 필수적인 것들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임산부들을 위한 패션도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미적인 부분보다는 편안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형이나 체질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디자인이 유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레깅스와 유사한 신축성 있는 소재의 디자인은 임산부만이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이라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임산부 패션이다.
입덧이 심한 임산부들을 위한 생약 성분의 약들도 많이 있는데, 음식으로는 생강이나 레몬, ‘water cracker’라 불리는 소금만 넣은 크래커, 페퍼민트 차 등을 먹곤 한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