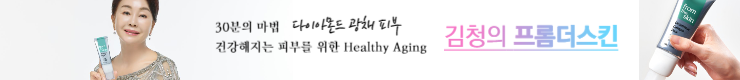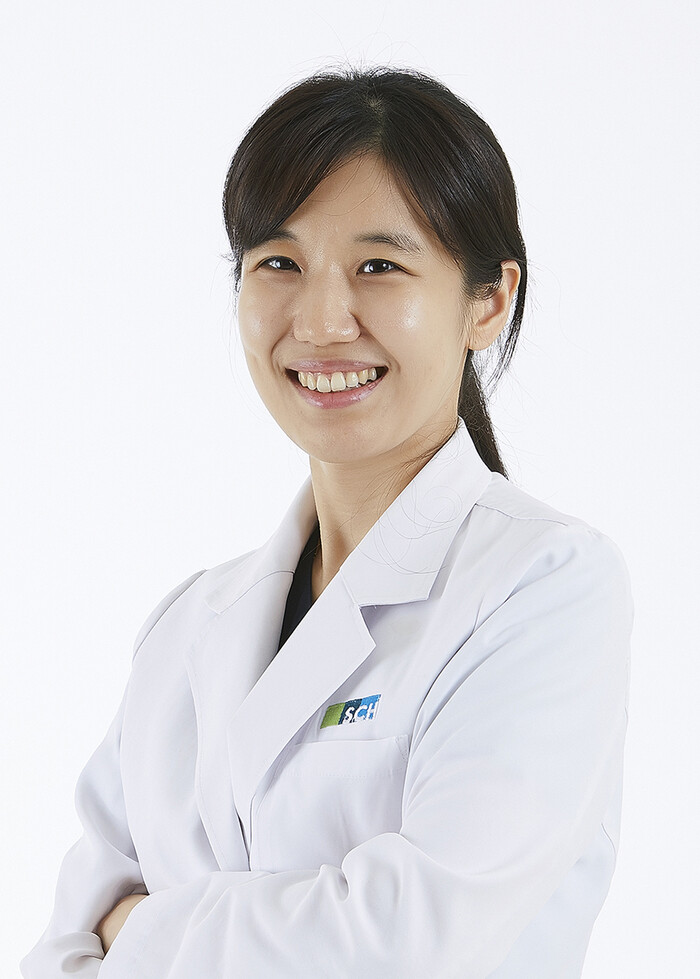 |
| ▲순천향대 부천병원 소아청소년과 박가영 교수[사진=순천향대 부천병원] |
[맘스커리어=김보미 엄마기자]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미숙아는 전체 출생의 8.3%에 이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태아의 폐 성숙은 임신 35주 전후에 이뤄지므로 미숙아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등 호흡기 질환이 발생하기 쉽다.
모든 신생아는 출생 직후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제대가 막히면서 폐를 사용해 호흡한다. 이때 미숙아는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하는 물질인 폐 표면 활성제가 부족해 폐가 쪼그라드는 무기폐가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해 진행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것을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라 부른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의 대표 증상은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호흡곤란과 청색증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빠른 호흡 △함몰 호흡 △숨을 내쉴 때 신음 △지속 무호흡증 △청색증 등이 더 심해진다.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면 호흡부전과 함께 혈압이 낮아지고 △체외 공기 누출 △폐출혈 △동맥관 개존증 악화 △뇌실내출혈 등 다른 장기들도 제 기능을 못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치료는 산전 치료와 산후 치료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산전 치료 방법은 산전 스테로이드 투여다. 임신 24~33주 차에서 향후 7일 이내 조기 분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임신부에게 스테로이드를 투여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34~36주 차 임신부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산후 치료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폐 표면 활성제 투여다. 아기의 호흡곤란 증상이 뚜렷하고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 호흡곤란증후군 소견이 발견돼 고농도의 흡입 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폐 표면 활성제를 투여한다. 이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뿐 아니라 각종 합병증의 중증도 및 빈도를 감소시켜 미숙아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28주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중 60%에서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호전 이후에도 기관지폐이형성증과 같은 만성 폐 질환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아기 초기에 감기 등 호흡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쌕쌕거림과 기침이 발생하고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 후 3년 동안은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박가영 교수는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 호전 이후 만성 폐 질환이 발생한 환자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가 많이 발생한다. 기관지폐이형성증이 있었던 미숙아는 9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 총 5회의 RSV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폐 발달이 미숙한 미숙아는 자발 호흡 노력 부족으로 출생 시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산 위험 인자가 있는 산모라면 신생아 소생술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좋다. 또 무호흡, 헐떡 호흡, 심박수 저하 등을 관찰해 양압 환기, 기관 내 삽관, 약물 치료 등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