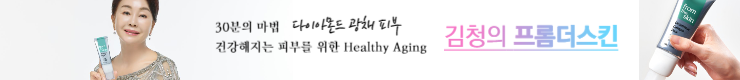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
| ▲위안부 소녀상[사진=픽사베이] |
[맘스커리어=최영하 기자] 여성과 관련해 존재하는 전 세계의 특별한 기념일을 다룹니다. 각각의 유래는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지정됐는지 그 이면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고민해 봅니다.
# “내가 위안부 피해자다” 첫 증언의 용기와 의미
-매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내 팔을 끌고 이리 따라오라고… 따라간다고 하겠어요? 무서워서 안 가려고 반항을 반항을 하니까 발길로 차면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너는 살 것이고 내 말에 반항하면 너는 여기서 죽는 거야. 결국은 이 꽉 물고 강간을 당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못다 하겠어.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1991년 8월 14일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증언에 나선 날이다. 이때부터 뜻있는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일제 만행을 규명하고 사과 및 배상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기념일로 인정받기까지는 이로부터 무려 3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시민들의 노력이 시작된 것은 증언이 있었던 이듬해인 1992년이다. 일본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 할머니들의 주도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1993년에 100회를 기록하고 2001년에 500회를 넘어서며 동일한 주제로 열린 최장기간의 시위로 이 기록은 매주 갱신돼 왔다. 2011년 12월 14일에 1000회 집회가 열렸고, 2019년 8월 14일 1400회 집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2만여 명이 운집했다. 해외 12개국 37개 도시에서도 동시에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의 범죄 인정과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즉각적인 진상 규명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에서의 진심 어린 사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공식 보상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식 기재 및 교육 △위령탑 및 사료관 건립 △전범자 및 책임자 처벌 및 징계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의 할머니들인데다가 일부는 건강이 악화되어 와병(臥病) 신세를 지거나 끝내는 노환으로 작고하시기도 하고 도중에 건강 문제 등으로 포기를 했던 경우도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성의 없고 변화 없는 태도를 보게 되면서 할머니들의 시위와 발언은 더욱 높아져서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처음 집회가 열렸던 당시에는 234명의 할머니들이 동참했지만 대부분이 고령인 데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할머니들이 건강 문제 등으로 시위를 포기하거나 끝내 별세하는 경우가 이어졌다.
다행히 이 와중인 2017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제정을 골자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문턱을 넘으면서 공식 제정됐다.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8월 14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후로 매년 기념일마다 위안부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과 전시회, 체험 부스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치러져 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행사가 어려웠던 2020년과 2021년에는 온라인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서울 은평공원을 필두로 부산·광주 등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