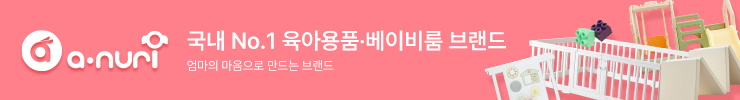|
| ▲박자양 강서교육복지센터 센터장 |
내가 우려하는 점은 한쪽으로 치우침이다. 어떤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질 때 우리의 법과 제도가 근본을 볼 수 있는 철학과 혜안이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이번 칼럼을 써 내려가본다.
국가를 안전하게 지탱해야 할 법과 제도가 여론의 힘에 떠밀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결정을 하게 될 때, 머지않아 그 문제는 곧 그 대상만 바뀔 뿐 또다시 반복되기 마련이다. 되돌아오는 데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모 아니면 도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거대한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과 학생 인권 모두가 공존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가?
교권 침해 사례가 터지면, 학생 인권이 너무 강화되었다고 문제 삼고, 학생 인권침해 사례가 터지면, 교권 인권이 너무 강화된 것 아니냐며 문제 삼을 것이 아닌가? 교사든 학생이든 역할 이전에 같은 인간이기에 모두의 인권이 중요하고, 모두 존중받고, 존중해야 할 대상인데, 우리의 의식 수준은 여전히 ‘인권’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할 만큼 사고의 확장이 되지 못한 것 같아 ‘나부터’의 자성이 필요한 때이다.
인간 사회에서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겉으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의식 저변에는 철저한 계급사회가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탓이라 말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분석 심리학의 카를 구스타프 융이 이론화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인간의 저변에 깔린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려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의 잘못된 의식은 의도적으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말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매 순간 깨어있어야 하는 자기성찰의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에서 강자와 약자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나, 이는 결국 언제든 그 위치는 상황에 따라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도 강자도 약자도 아닌 인간이기에 서로 존중하는 사회는 과연 현실 불가능한 것인가? 나의 이런 바람이 마치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비현실적 이상일 뿐인가? 우리가 언제까지 이분법적 프레임에 갇혀 서로 상처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인가? 의미 없는 것에 쓰고 있는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결국 나를 향한 자성의 질문이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던지고픈 나의 질문이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