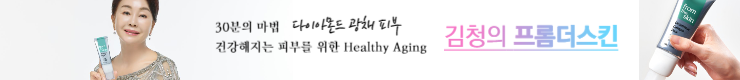|
| ▲ 김승연 굿마인드 심리상담센터 원장 |
[맘스커리어=강수연 기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E. P. Seligman) 교수는 개도 무기력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1조와 2조 그리고 3조로 개들을 구룹을 지었다.
그래서 1조 그룹의 개들은 실험실 안에서 전기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개들이 우연히 눌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코로 계기판을 누르면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전기충격이 멈추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2조는 1조와 동일하게 전기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전기계기판을 눌려도 전기충격이 멈추지 않게 했다. 단 1조에 있는 개들이 전기계기판을 눌렸을 때만 전기충격이 멈춰지게 한 것이다. 그러나 3조는 아무런 충격이 받지 않게 시설을 했다.
다시 말해서 1조의 개들은 전기충격을 통제하는 법을 배웠고, 2조의 개들은 무엇을 하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2조의 개들은 무기력을 경험한 것이다.
동일한 그룹의 개들로 이동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 안에 이동식 칸막이를 설치 했다. 이동식 칸막이 왼쪽은 전기충격이 있는 지점이었다. 전기충격이 있지만 이동식칸막이를 뛰어넘으면 오른쪽에는 전기충격이 없는 지점으로 개들이 피할 수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앞전 실험에서 전기충격을 통제하는 법을 경험한 1조의 개들과 전기충격을 경험하지 않은 3조의 개들은 전기충격이 있는 자리에서 전기충격이 느껴지면 얼른 이동식칸막이를 뛰어넘어서 오른쪽에 전기충격이 없는 자리로 고통을 피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경험했던 2조의 개들은 전기충격이 있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
이동식칸막이가 높지 않아서 그냥 뛰기만 하면 고통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고통이 느껴지는 그대로 느끼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떨까. 인간은 내가 어떤 노력을 했었을 때 그 노력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고를 학습하게 된다.
"예전에도 해봤어. 그런데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어"라는 경험이 지속될 때마다 고통스런 상황을 벗어나고자 스스로 노력하려는 행동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기력이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긴 어렵지만 핵심적인 것은 인간은 행동을 하는 것에는 과거 학습된 것에 의해서 자신에게 원인을 찾는 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똑같이 시험결과가 좋지 않아도 어떤 학생은 자기가 머리가 나빠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학생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으니 다음번에는 부족한 것을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설레그먼의 귀인이론을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엄마의 반응이 없다면 아이들은 어떤 마음을 경험할까?"를 생각해본적이 있었다. 아무리 울어도 엄마의 반응이 무반응이거나, 언제나 일관되지 않은 모습으로 나를 양육한다면 또는 엄마의 통제가 너무 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말이다.
상담소를 개소하고 첫 번째 내담자를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첫 번째 내담자이기도 했지만 그 청년의 이야기는 여러모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내용이었다.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자세히 설명은 않겠다. 그러나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무기력에는 아버지의 통제가 결정적이었다.
아버지가 자신의 진로를 선택 결정하고, 가족 불화로 인해 자신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던 환경에서 무기력을 학습하게 된 것이다. 대학생이 되었지만 작은 결정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지만 그렇다고 그런 현실을 극복할만큼의 마음의 힘이 있지도 않기도 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그냥 텔레비전만 보는 것이었다. 자녀가 무기력하게 되기까지는 어느날 갑자기 일어난 결과가 아니다. 그 무기력에는 부모의 통제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사랑한다. 사랑의 방식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최선이고, 모두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랑은 자녀의 입장에서 사랑으로 느껴져야만 사랑이 되는 법이다.
무기력한 청년들이 너무 많다. 아동들 역시 마찮가지다. 상담소를 찾는 청년과 청소년들의 마음의 문제 중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기력이다.
그렇다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통제력이 너무 강한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 자녀와 항상 대화하고 자녀의 선택이 부모님들 보기에는 부족해보여도 그래도 그 선택을 신뢰해줘야 한다.
그 선택이 실패를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부모가 모두 해결사처럼 처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이의 성장을 기다려주는 것이다.
[ⓒ 맘스커리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